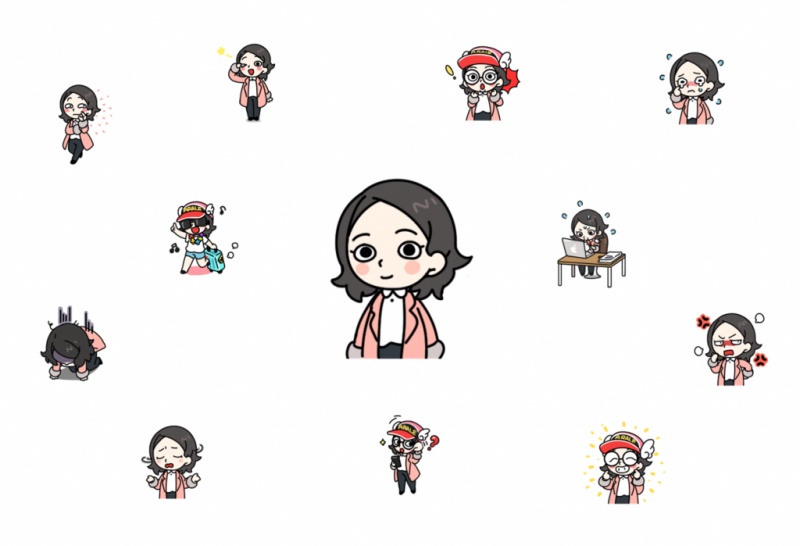새로운 회사로 옮긴 지 일주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수습’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도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선택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다. 기사다운 기사를 쓰는 기사를 되기 위해, 팩트를 쫓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기자로서의 삶, 기사 하나를 송고하기 위해 거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사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다시 지옥의 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금까지 너무나 편한 삶을 살아왔다. 9시부터 6시까지 정규 근무 시간 내에 맡은 일을 다 끝내면 칼같은 퇴근도 문제없었고, 주어진 연차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기자’라고 불리는 이름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다. 발로 뛰는 취재도 없고, 팩트를 쫓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자 본연의 자세를 잃은 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기자님은 취재하느라 이곳저곳 다니시지 않으세요?”라는 말에 침을 꼴딱 넘기기 일쑤였다.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사무실에 앉아 번역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에디터’로서의 삶을 지향하고 이곳에 흘러들어왔다. 기업의 실적이니, 공시니, 주식이니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었다. 제품 활용법에 주안을 둔 피처 스타일의 기사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몇 달 전 에버노트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많은 독자가 기업 경영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해외 한 블로거의 추측성 게시물로 시작된 “유니콘 기업, 에버노트의 추락”이라는 이미지는 국내로도 전파돼 많은 에버노트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에버노트 곧 망하겠다, 원노트로 갈아타야지” “내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에버노트, 망하면 안 되는데…”라는 댓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에버노트 활용법에 관한 관심을 잠시 내려두고, 에버노트의 사용자 수, 투자 금액, 서비스 업데이트 날짜 등 에버노트 기업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필 리빈 집행역 회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유료 가입자 전환율 등의 숫자를 대조해 해외 블로거가 근거로 내세운 정황들이 ‘위기의 에버노트’를 설명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작업한 글 : 위기의 에버노트, 성장하는 에버노트
그리고 이 기사를 작성했다. 지금까지는 에버노트의 기능성, 활용성에만 치중한 기사를 썼지만, 기업 운영에 관한 소상한 이야기를 적은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에버노트 팬이라면, 진정으로 에버노트가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때부터 생각해봤다. 에버노트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약 내가 기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블로거가 아니라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곰곰이 생각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주고,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 앞으로 현대사회에 끼칠 미래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일해야 하는지, 어떤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지 고민해봤다. 지금처럼 자유분방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기사체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객관성을 담보로 더 많은 독자로부터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만 했다. 내 느낌보다는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팩트를 쫓아야만 했다.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지금까지 눈대중으로 대충 배웠던 기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회사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기자로서 필요한, 기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실 쉽지 않다. 지금도 후회가 된다. 제 발로 지옥 불에 뛰어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왜 그랬을까, 조금 더 고민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미련도 남아있다. 10년, 20년 일할 체력은 있는지, 지구력은 있는지, 악바리가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그러다 끝까지 해내는 놈이 잘할 것이라는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럴 것 같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내 나이 동기는 더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터다. 이 모든 고민은 정식 기자로 발령받고 나서 생각할 일이다. 두렵지만 이제 첫 시작이다. 어떻게든 버텨서 좋은 기자가 될 거다, 꼭.
Feature image by 🎄Merry Christmas 🎄 from Pixabay


 사회부 기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나
사회부 기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