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몇 해 전 1500명 규모 컨퍼런스를 기획하던 때 일이다. 외부 디자이너와 컨퍼런스 컨셉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디자인’이라는 도메인,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우리는 디자이너로부터 하나의 링크를 전달받았다. 컨셉 디자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다리가 길다’, ‘팔이 짧다’, ‘색깔이 어둡다’라고 감 놔라 배 놔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괴물이 하나 탄생했다는 그런 컷 툰 형식의 블로그였다.
디자이너는 짧지만 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아차 싶었다. 디자이너의 감수성, 그리고 경험을 전적으로 믿고 작업을 맡겼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했다. 당시 ‘이런 느낌대로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디자이너의 영감에 의지했어야 했던 우리는 그 컷 툰 속 인물처럼 디자인에 대한 몰이해로 디자이너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사례 중 하나다.
#2.작년 5월 일이다. 서울 홍대에서 한 모임을 파하고 나니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온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마침 우산을 가져온 한 친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는 고마운 제안을 했다. 우산 아래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햇수로 사회생활 5년 차와는 달리, 그는 아직 취준생이었다. 기획 쪽 일에 관심 있어 보이는 듯했다.
이런 일을 해보는 거 어떠냐, 잘 아는 영어를 살려보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인생에 선을 넘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친구를 벌써 ‘철없는 친구’라 선을 긋고 대하고 있었던 거다. 나와는 달리 아직 그가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사정이 있었을 거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수많은 방황 속에서 확신을 갖고 이제 겨우 홀로서기를 하려는 친구의 고민을 먼저 들어볼 생각은커녕,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며 훈계질만 했다. 이런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다.
#3.건너 건너 아는 회사에서 조만간 행사를 하나 연다. 행사 관련해서 내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미팅에 참석해 이 행사를 왜 기획하게 됐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강사진이 참여하는지 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들었다. 기술 커뮤니티에서 보기엔 현실과는 지나친 동떨어진 이야기로 구성된 감은 없지 않아 있었고 그에 관한 내용을 몇 문장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다.
이들만큼 오랫동안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한 적도 없었고 대중들을 위한 강연을 꾸려나가기 위해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 적도 없었고 강사진 섭외부터 시작해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보여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요”라고 말하는 건 실무진에 대한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가할 만한 강사진 목록을 추려서 전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4.웹서비스 하나를 리뷰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리뷰해왔던 다른 생산성 콘텐츠는 사실 몇 해에 걸쳐서 쌓인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것이기에 나로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황(여행, 영어공부 등)에서 여러 앱과 도구를 잘 이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전적으로 내 노하우를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웹서비스에 관한 글을 쓸 때는 노하우를 발산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이런 웹서비스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글과는 달리 ‘리뷰’ 카테고리에 글을 분류한 뒤 글을 퍼블리싱했다.
그날 오후, 장문의 댓글이 하나 달렸다. 지금까지 생산성 관련 글을 잘 봤는데 이번 글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댓글이었다. 그때 힘이 정말 푹 빠졌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축적해온 노하우를 글로 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또 그걸 글로 잘 풀어보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런데 겨우 한 번. 그것도 ‘리뷰’ 카테고리에 배치한 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 내가 남긴 답변엔 그 이후 피드백은 없었고 나는 소심하게 그 사람이 예전에 보내온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거절’했다.
1.이처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야 하지 말아야 ‘선’을 아슬하게 탈 때가 많다. 대개의 실수는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깊이 있게 헤아려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오만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되도록 누군가의 결과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재단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그럴 만한 실력이나 경험, 혹은 고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건 상대의 성의나 노력을 기만하는 것이다.
2.그렇다면 내게는 누군가 넘지 않았으면 하는 ‘선’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글을 쓰는 걸 업으로 삼고 있으니 글에 관련된 분명한 선은 있는 듯하다. 글을 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글의 방향성이나 목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때 나는 상대방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럴때면 감정이 복잡해질 때로 복잡해진다.
3.글이란 것은 디자인처럼 그걸 하는 사람의 감성 또는 경험(어떤 책을 보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에 따라 발현되는 창작물이라고 본다. 소설, 신문기사, 에세이 등 어떤 장르의 글이라도 말이다. 이미 글쓴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난이도로, 어떤 문체로 쓸지 다 정한다. 나는 이걸 스타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봐야 할 때도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다. 이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체 중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엉덩이의 힘(?)으로 난 자식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사전적 이해가 없이 그 사람의 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4.상대방이 편집장이라면 또 모르겠다. 그에겐 그만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은 ‘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한다. “나한테 돈(월급) 줄 것도 아니면서 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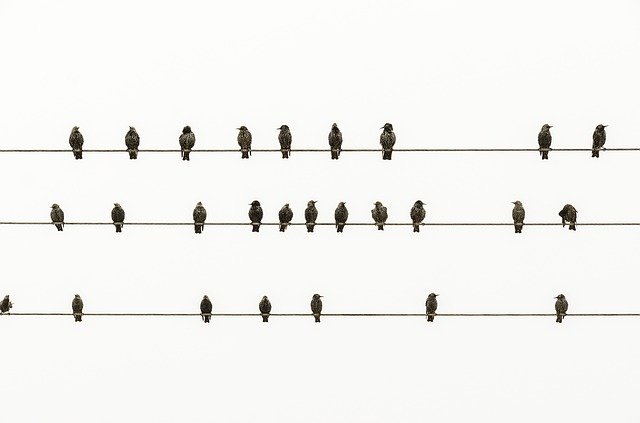

 연말파티 혼자서 기획해본 후기
연말파티 혼자서 기획해본 후기